인턴의사의 좌충우돌 생존기…박성우의 '인턴노트'[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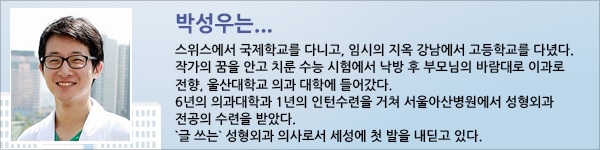
4월 일정은 내과 중에서도 소화기내과 인턴이었다. 거대한 종합병원에는 소화기내과도 간 전문과 췌담도 전문, 내장 전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인턴은 모두 6명이었다. 소화기내과는 A파트, B파트, C파트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나는 그중 간 전문 A파트 인턴으로 보내졌다.
"네, GI A인턴 박성우입니다."
호흡기내과에서 소화기내과로 병동을 옮겼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환자들이 잘 걸어다닌다는 사실이었다. 호흡기내과는 폐 질환으로 인해 환자들이 늘 숨에 차서 심한 경우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어 했다. 늘 산소포화도를 감시하는 기계와 산소를 공급하는 콧줄, 마스크 등을 쓰고 있어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기계들도 많았다.
반면 소화기내과 환자들은 대부분 호흡하는 데 힘겨워하지 않았고 달고있는 기계도 적었다. 걸어다니는 데도 불편함이 없었고 겉모습만 본다면 건강한 환자들이 더러 있었다. 그래서 늘 침대에 누워있는 호흡기내과 환자들과 달리, 매번 산보를 나가 자리를 비운 환자들을 찾으러 다닌 적이 더 많았다.
대신 간 질환에 이어 발생하는 복수 때문에 배가 산처럼 차오른 환자들과 황달로 얼굴 빛이 담황색인 환자들이 있었다. 소위 '얼굴이 누렇게 떴다'는 표현이 어울렸다.
새벽 5시마다 1시간 정도 그날 퇴원하는 환자들이나 오전에 시술받는 환자들의 채혈을 했다. 새벽 4시 40분에는 부스스 침대에서 나와 고요한 병동을 흡혈귀처럼 돌아다녔다. 그렇게 '5A lab'이라 부르던 채혈을 마치면 어느덧 6시가 되어 날이 밝아 있었다.
간암 병동에서는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이나 고주파열치료(RFA) 등의 국소치료로 성과를 거두고 있었기에 5일 정도 짧게 입원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을 붙이고 친해진 환자들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환자들을 지켜보니 간암보다 무서웠던 것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 그리고 간경화였다. 채혈 도중 바늘에 찔리게 되면 B형 혹은 C형 간염의 감염에 노출되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혹 바늘 사고가 일어날 때는 벌벌 떨며 응급실에 가서 채혈하고 검사를 받기도 한다.
환자들은 진행된 간경화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식도나 위 정맥류로 내시경 시술을 받으며 고통스러워 했다. 환자에게 식도정맥류가 터지는 상황은 말 그대로 피를 토하는 응급이었다. 당직을 서던 새벽, 갑자기 토혈하는 환자 때문에 비위관 L 튜브를 넣고서 4리터고 5리터고 위세척을 하기도 했다. 그래도 토혈이 진정되지 않으면 응급으로 내시경을 하기 위해 환자침대를 끌고 고요한 병동을 내려가던 새벽 2시의 기억도 있다.
한동안 멀쩡하던 환자들도 간 혼수(Hepatic Encephalopathy)가 닥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폭력적으로 변한다. 간 혼수에 빠진 환자는 섬망이나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고 현실 인식을 못한다.
처치를 위해 간호사 3~4명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하는 환자를 꼭 붙잡고 관장을 해서 멀쩡하게 돌려놓기도 했다. 여자 동기는 간 혼수 환자를 진정시키다가 손가락을 물려 손톱이 빠지기도 했다. 당직의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던 소화기내과 인턴의 애환이다.
같은 질환을 다루는 베테랑 교수님 사이에서도 환자를 대하는 철학과 치료법이 다르다. 곁에서 지켜보면서 되고 싶은 의사 상을 생각해보았다. 현재까지의 의학적 경험과 확률로 환자에게 냉정하게 죽을 확률을 선고하는 모습도 보았고, 반대로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에게 간 이식을 하면 된다고 우울한 환자를 격려하는 모습도 보았다.
"환자분 간이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안에 죽을 확률이 90퍼센트입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와 "환자분 지금까지 치료 잘 받고 버텨왔는데 왜 포기한다고 하십니까. 지금보다 치료를 더 잘 받고 용기를 내야죠. 힘냅시다" 처럼 서로 다른 교수님들의 접근법을 비교하며 배우기도 했다.
벚꽃이 흐드러지고 노란 개나리가 얼굴을 내밀 즈음 4월의 인턴 생활은 지나갔다. 마지막 날 노(老) 교수님께 인사를 드렸다. 씩씩했던 모습이 보기 좋았고 지금 그대로의 표정을 잃지 말라고, 한 달을 마치는 새내기 의사에게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또다시 한 달 같이 일하던 선생님들, 간호사들과 친해지기도 전에 다시금 떠난다.
소화기내과, 안녕.
<20편에서 계속>
※본문에 나오는 '서젼(surgeon, 외과의)'을 비롯한 기타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저서 '인턴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