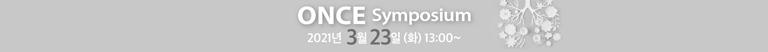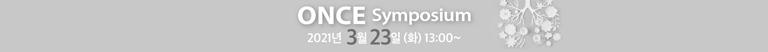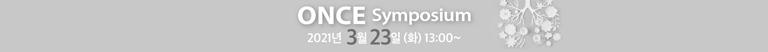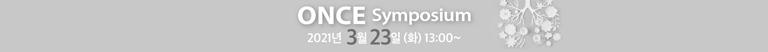의사 추계 두고 의-정 팽팽 "통계적 유희"vs"과학적 근거"
13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는 의협회관에서 공동으로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의사 부족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소설을 쓰기로 작정한 것인가?" vs "가용한 자료 내에서 도출한 최선의 결과"보건복지부가 2040년 최대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내놓으며 의대 증원에 시동을 걸자 의료계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한 소설"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정부의 추계 방식이 미래 정책 방향성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통계적 유희'에 가깝다는 것이 의료계 전문가들의 평.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끼워 맞췄다고 비판하자 복지부는 즉각 반박하며 "현재 시점에서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고 맞불을 놓으며 평행선을 달렸다.13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는 의협회관에서 공동으로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의사 부족 논리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 5,938명~13만 8,206명, 공급 13만 3,283명~13만 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하고 2040년에는 부족 규모가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장부승 관서외대 교수는 한-일의 추계 방법론을 비교, 한국 정부가 부실한 데이터에 기반해 추계했다는 점에서 "소설을 쓰기로 한 것이냐"고 작심 비판했다.이와 관련 장부승 관서외대 교수는 우리 정부의 추계가 미래 의료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가장 큰 결함으로 꼽았다. 장 교수는 일본의 경우 '지역의료구상'을 통해 향후 인구 구조와 의료 요구 변화에 따른 병상 기능 재편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 의사 수를 도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한국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이나 의료 전달체계 혁신 등 수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정책 변수를 추계 과정에서 배제했다. 장 교수는 "미래 의료 제공 체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방향성 없이 과거 데이터만 활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정부가 사용한 시계열 모형(ARIMA) 등 통계 기법이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일본이 의사의 실제 근로 시간, 병상 기능별 현황, 의대 학장 및 병원장 설문 등 구체적인 현장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과 달리, 정부는 "관측 가능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만큼 추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논리다.장 교수는 "정부는 장기 시계열 자료 확보의 한계를 언급했지만 이는 장기 추적 조사를 안 한 것"이라며 "근무 일수나 생산성 등도 관측 불가능하다고 가정했지만 이는 관측을 안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그는 "한국의 추계 담당자들은 현장 데이터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할 뿐 현장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일본은 막연한 추정이나 외삽보다는 현장 관찰 및 설문 조사 기법을 통해 획득한 구체적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심지어 2018년 1차 추계 이후 추계 결과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기초 데이터를 현장 점검하고 보강해 2020년 2차 추계를 실시했다"며 "반면 한국은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설을 쓰기로 작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과잉 시대 온다" FTE 기준 시 정반대 결과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인구 감소 추세는 간과한 채, 1인당 의료 이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업무량이 아닌 진료비 비율을 적용해 입원 업무량을 과다 산출함으로써 의사 수요를 부풀렸다는 분석이다.박 연구원이 의사의 실제 근무 시간과 생산성을 반영한 전일종사자(FTE, Full-Time Equivalent) 기준으로 다시 추계한 결과는 정부 발표와 정반대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40년에는 오히려 약 1만 4,684명에서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인력 추계 결과. FTE 기준을 적용한 결과 2040년 오히려 의사 인력이 약 1만 8천명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추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박 연구원은 "위원 구성이 직역 전문직 비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격주 간격의 다급한 회의 진행과 짧은 발언 시간 등으로 인해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꼬집었다.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는 추계 과정의 불투명성과 결과의 변동성을 문제 삼았다. 실제 추계위는 임상 활동 비율 등 변수를 조정하면서 2040년 부족 인원의 최솟값을 5,704명에서 5,015명으로 수정하는 등 결과가 수시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정부가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치를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현장의 불신을 키우는 대목이다. 정부는 통계적 모델링을 통해 '부족한 수치'를 증명하는 데 집중한 반면, 이날 전문가들은 현장 데이터와 정책 방향이 빠진 통계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의료계의 비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추계위는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ARIMA 모형은 과거부터 축적된 의료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추계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적 방법"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코로나19와 의정 사태 등 최근의 의료이용 변화 양상까지 전수 활용해 모형을 적용했으므로 통계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해명했다.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도 추계위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됐으며, 의사협회 추천 위원도 포함돼 총 12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회의록과 안건 자료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고 설명했다.추계위는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본질적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 이번 추계 결과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복지부는 2026년 1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정원 규모를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