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민 연세의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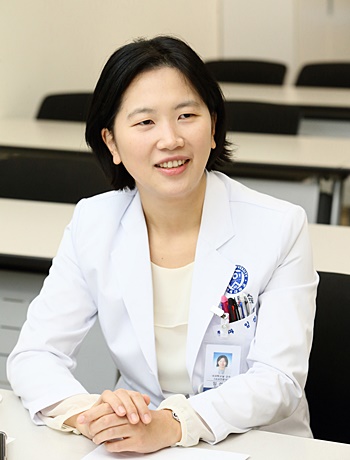
글로벌 다국가 폐암연구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폐암센터에 30대 후반의 젊은 기수 임선민 교수(종양내과)가 합류했다.
임 교수는 연세의대에서 인턴, 레지턴트 수련을 마친 이후 임상강사, 임상연구조교수로 활동하면서 2014년 연세암병원 개원과 폐암센터를 준비하는데 충추적인 역할을 했다. 센터를 총관장하는 조병철 교수의 첫 제자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임 교수에게 폐암센터는 그 어떤 곳보다 애정이 많은 곳이었지만, 돌연 2015년 분당차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선언하며 떠났다. 새로운 곳에서 종양내과 진료를 구축해보자는 김주항 교수의 요청을 마다할 수 없었고, 덕분에 지난 5년간 진료교수로서 값진 경험을 했다.
그랬던 그가 5년만에 다시 돌아왔다. 어떻게 왜 돌아왔냐는 질문에 임 교수는 "쉽지는 않았다"고 수줍게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평소 품었던 열망과 타이밍의 합작품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회귀본능이 작용했다. 임 교수의 성장태반은 다양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었던 폐암센터였고, 그 곳 양분을 먹으며 탐구하고 개발하는 의사로 성장했는데, 자리가 바뀌어도 본질적 유전자를 바꾸지 못한 것이다. 그는 성장과 더불어 고민이 커졌고 때마침 스승의 부름에 자연스레 이끌려왔다.
임 교수는 "이전 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곳이지만 많은 임상경험과 치료제 개발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곳이었다"면서 "종양내과 임상의 입장에서 다양한 임상경험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 끝에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자기계발을 위해 선택했고, 솔직히 기회의 운도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힘들고 어려운게 더 매력적이죠"
이에 따라 합류한 임 교수는 지난 3월부터 쉴새없이 환자와 만나고 있다. 이전 경험보다는 더 많은 다양한 폐암 환자를 만나고 있고, 표준치료,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험지 아닌 험지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세브란스병원 폐암센터는 녹록한 곳이 아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개 암진료과에 불과하지만 이곳에 근무하는 의료진입장에서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최근 몇년간 폐암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500명에 달하는 환자를 봐야하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넘쳐나는 환자로 의료진들은 상담에 녹초가 되기 일수고, 덩달아 간호사들은 환자들 교육에 진땀을 빼야한다.
게다가 글로벌 임상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123개의 신약임상이 돌아가고 있으며,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만도 50여명에 달한다. 규모만 100억원으로 달한다. 진료는 물론 임상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칠 작업을 모든 교수가 해야 한다. 그야말로 숨톨릴 틈없이 바쁘고, 치열하게 움직이는 곳에 임 교수가 서있는 셈이다.
이러한 혹독한 도전과 개발이 기다리고 있지만 두렵지 않은 건 단 하나. 다양한 환자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과 나날이 발전하는 치료법을 눈앞에서 적용하면서, 연구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임 교수는 "다양한 표적신약들의 임상연구와 전임상연구에 참여한다고 상상하면 기대가 크다"며 "환자풀도 굉장히 다양하고, 인프라도 많아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자기만의 치료기준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좋은 예후로 환자에게 보답하는 것은 모든 임상의의 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환자만 진료하는 신환데이 전담할 것"
그렇다고 환자진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폐암센터의 가장 큰 숙제는 넘쳐나는 폐암 환자를 지체없이 진료하는 일이다. 이를 해결해야 병원실적도 좋아지고 새로운 환자(신환)도 더 늘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전담의사 시스템을 제안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진료일 하루를 신환데이로 정한 것이다. 이날은 새로운 환자를 전담마크해 하루종일 신환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일 접수, 당일 피검사 가능하고 환자들의 진료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교수는 "병원에 오신분들은 공감하겠지만 대형병원에서는 예약잡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심지어 몇개월씩 기다려야하는 일도 다반사다. 이러한 구태를 과감히 개선해보려고 한다"며 "이외에도 네이버 카페와 환자 교육프로그램도 참여하며 환자간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빠르게 변하는 폐암 치료...주치의 판단이 중요"
임 교수는 젊은 세대의 대표주자답게 논쟁이 많은 학술적 견해도 자기주장이 뚜렷하다. 이슈가 됐던 비소세포폐암 EGFR 돌연변이 표적 치료제에 선택기준에 대해서는 근거와 경험을 믿는 편이라고 말한다.
임 교수는 " EGFR 돌연변이 표적치료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논쟁이 활발하지만 나름의 기준이 있다"면서 "임상경험을 되짚어보면 1세대보다는 2세대 치료제가 더 효과가 좋았고 내성 이후 3세대 치료제를 썼을때도 예후가 괜찮았다. 독성문제도 용량감량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3세대 EGFR 돌연변이 표적 치료제의 경우 뇌전이있을때 효과가 좋고, 젊은 환자, 최초 다발 전이 환자들의 경우 일차 옵션으로 선택했을때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면역항암제의 경우는 아직은 대체로 반응률이 낮아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보기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반응예측 바이오마커가 개발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는 반응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병용요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향후 폐암 치료에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폐암치료의 견해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폐암치료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연구가 센터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