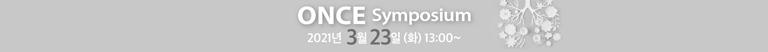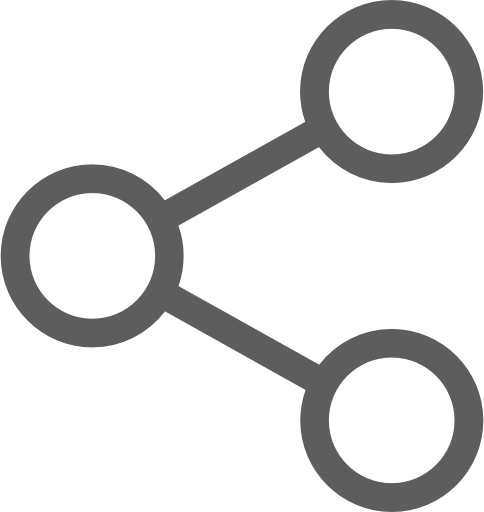1만 1299명 대상 심층 합성곱 신경망 모델 검증 성공
80% 정확도 진단 성공…"저렴한 선별검사 활용 가능"
심전도만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높은 정확도로 진단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이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경우 고가의 수면다원검사 외에는 진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저렴한 선별검사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0일 미국심장학회지(JACC)에는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의 검증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10.1016/j.jacadv.2025.102139).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OSA)은 말 그대로 수면 중 호흡이 이어지지 않는 질환으로 심각한 심혈관 합병증을 동반한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 환자가 9억여명이 넘어가는 등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특히 수면 중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만약 증상을 자각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의 감시 하에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해야 하는 고가의 수면다원검사 외에는 진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허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메이요클리닉 비렌드 소머스(Virend Somers)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심전도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감지 모델을 개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수면무호홉증이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심장 근육세포의 전기적 활동의 변화를 학습시킨다면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메이요클리닉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1만 1299명의 12리드 심전도 결과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고 이에 대한 검증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모델은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곡선하면적(AUC)가 0.80을 기록했다. 10명 중 8명은 심전도 결과만으로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 인공지능 모델은 민감도가 77%, 특이도는 68.6%를 보였다. 위양성이나 위음성 확률도 적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이러한 정확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남성의 경우 AUC가 0.73을 기록한 반면 여성은 0.82로 더 나은 선별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심전도만으로 이렇듯 수면무호흡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선별검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렌드 소머스 교수는 "고가의 수면다원검사 외에는 마땅한 진단법이 없던 수면무호흡증을 심전도 결과만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발견"이라며 "이 알고리즘을 의료 현장에 적용하면 매우 저렴한 선별 검사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