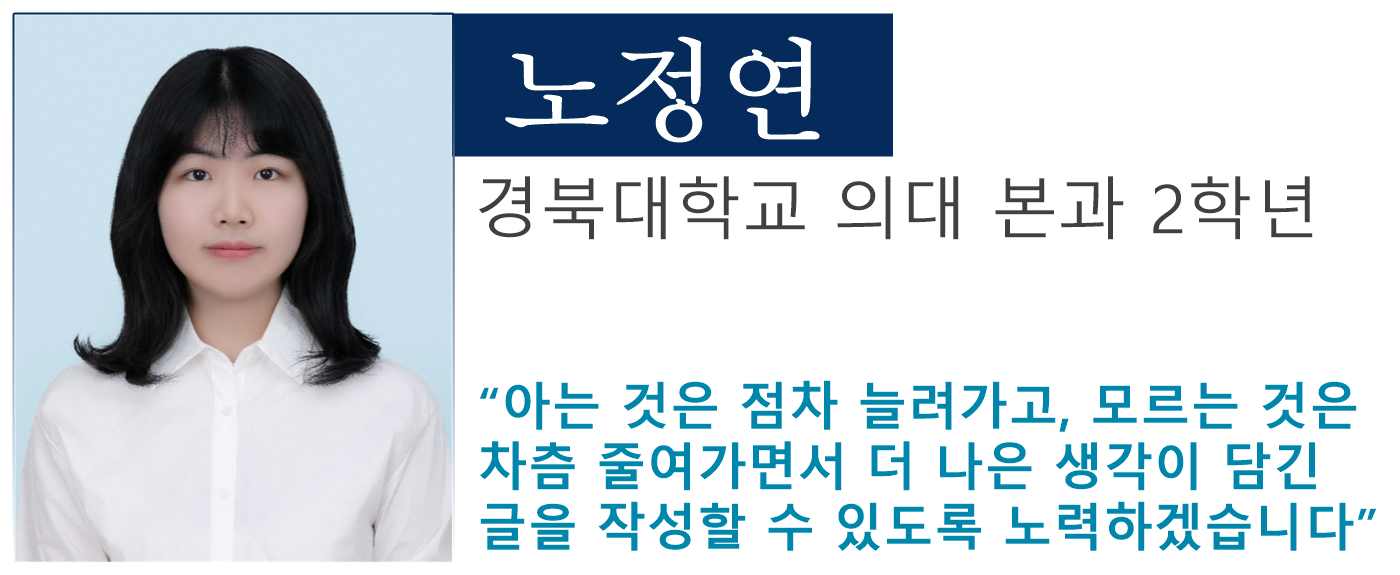경북대학교 의대 본과 1학년 노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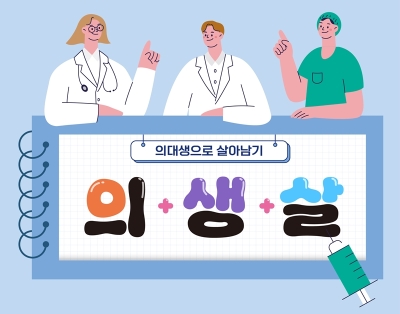
기관 삽관 실습수업 날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접해보는 모형의 기도를 찾기 위해 갖은 애를 쓰던 와중,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앞에 모형이 아니라 부모님이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라"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저는 정신을 똑바로 붙들고 침착하게 기관 삽관을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울고만 있지 않으면 다행일 테죠. 상상만으로 몸서리가 쳐지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상상이 아닌, 일상 속에서 마주할 다분히 현실적인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응급 구조대의 출동 건수는 336만 건에 달합니다. 하루에만 평균 9,000건 이상의 응급 환자 이송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절대 작다고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슬픔은 마치 그림자 같아서 구태여 내려다보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그 존재의 가능성마저 잊은 듯 살아가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데, 어떻게 매번 피해 가길 바랄 수 있을까요? 병원을 오가며 스쳐 지나갔던 수없이 많은 환자분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귓가를 울리던 사이렌 소리를 떠올리니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미래에 의사가 되어 마주하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 모두 잠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달파지는 슬픔들을 매순간 견디고 계실 것이라는, 다분히 현실적이면서도 잔인한 이 문장의 무게를 이제서야 가늠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학문은 질병에 대한 것입니다. 주로 질병의 원리와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들이죠. 의학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들을 분석한 후, 일관된 진단 기준 및 치료 방안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전에는 원인조차 알 수 없던 병들이 이제는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바뀌기도 했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새 생명을 선물하기도 했죠. 하지만 과연 이걸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수치들은 결코 눈물 흘리는 법이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환자들은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안고 내원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엄청나게 슬프고, 또 어떤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게 있어 질병은 정량화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하고도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과연 의사로서 우리는 환자의 슬픔을 모두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환자의 슬픔을 헤아리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형철 문학 평론가는 저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심장이다.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만 뛴다. 타인의 몸속에서 뛸 수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럴 때 인간은 심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이다."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 출판(2016))
상대방의 고통에 결코 가닿지는 못하더라도, 그 한계를 슬퍼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슬픈 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슬퍼하는 누군가의 심장을 홀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 인(人)자가 서로 기댄 모습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형상화한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을 결코 온전히 이해하거나 합일할 수는 없더라도, 서로에게 기대어 잠시 쉬어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영원히 슬픔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더 견딜 만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슬퍼하는 사람을 무수히 많이 보게 될 의학도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 가짐 중 하나는 슬픔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자의 슬픔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의사의 덕목이자 윤리일 테니까요. 무엇 하나 동일한 슬픔이 없을 것이고 또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을 공부해도 계속 모자라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