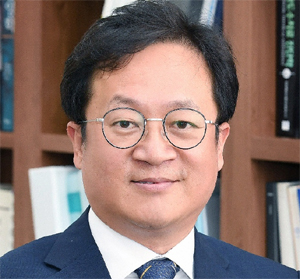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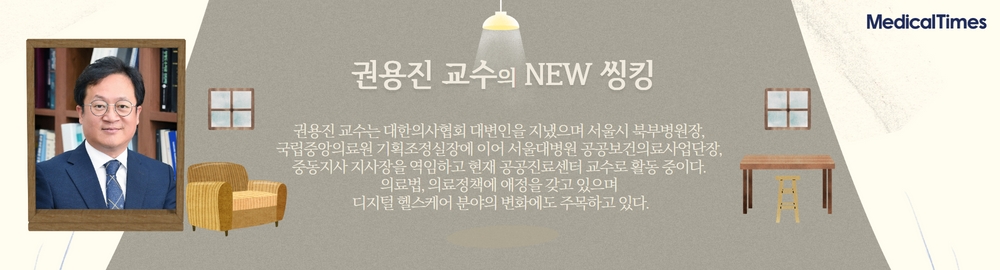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대책'에는 병원 얘기가 담겨있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정부정책에서 병원 얘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의료사회복지사의 수가를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감개무량하기까지 하다. 2013년 서울시립북부병원의 301네트워크가 병원 사회복지사들을 동원해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시작한 지 10년만의 일이다.
처음 병원은 어떤 기관이었을까? 중세시대 병원은 교회가 운영하는 종교기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선과 구휼기관이었다. 19세기에 들어서 박테리아가 발견되고 위생의 개념이 생기면서 병원은 진단과 의술을 행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중원이나 초기 시도립병원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던 기관이었다. 이런 기록은 병원이 과학에 기반한 의술을 행하는 곳일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가진 기관이었음을 의미한다.
병원이 이런 역사를 가졌음에도 작금의 병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이 많아져서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문턱이 높게 느껴진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료급여제도)가 어느정도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비급여진료가 있는 한 그 문턱을 낮추기는 어렵다. 환자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내가 부담할 수 없는 의료비가 청구될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를 개선해 본인부담 문턱을 낮추면 될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비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의 효과를 높이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제도주의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작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심리적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서울시립북부병원 301네트워크로 의뢰된 환자들의 80% 이상이 정신과진료 협진을 받았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의 반증이다.
따라서 제도개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해 줄 병원 내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병원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두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욕구에 따라 자원을 찾아 매칭해 줄 전문가와 시스템이다. 최근 전문분야가 법적으로 인정된 의료사회복지사가 가장 적합한 인력이다. 환자들이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찾아갈 수 있는 공간과 상담실이 필요하다. 전화번호는 전국이 같은 번호를 쓴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301'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하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다. 의사들이 직접 찾아가면 가장 좋지만 훈련된 간호사로도 충분하다.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한다면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는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부족하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줘야 하는 이유다.
국가는 발전했고 병원은 많아졌지만 현재 병원들은 지역사회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 보인다. 병원이 이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병원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병원의 역할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