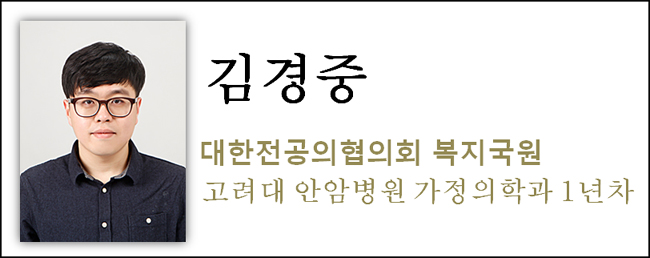김경중 전공의(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1년차)

"일단 제가 가겠습니다. 무조건 갈 겁니다. 당직을 옮겨서라도 가고 말 테니깐, 어떤 경우에도 제가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 정말 몰랐다. 내가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병원에서 야구 의료 지원을 나갈 줄이야! 지원 의사를 묻는 순간, 망설일 필요조차 없었다. 생각이 많아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나로서는 엄청나게 빠른 반응이었다. 왜냐고? 야구라고 하면 눈 돌아가는 나에겐 의료 지원은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야구 덕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중의 기회였는데, 이걸 마다할 리가 있겠나?
부산의 야구 구단인 롯데 자이언츠 요청으로 경기 2시간 전부터 야구장에 머물렀다. 매일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던 사직 야구장의 중앙 게이트는 선수들이나 구단 관계자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으로 입성했을 땐, 의료지원이고 나발이고 설렘이 넘쳐흘렀다. 와! 내가 여기로 들어오는 날이 있다고? 의사하길 잘했네!
관중석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그라운드를 밟아보기도 했다. 그곳에 내 발을 잠깐이나마 들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물론 경기 전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SSG 선수들과 롯데 선수들의 연습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연습하는 모습조차 바라보기만 해도 좋더라. 이거야말로 야구를 좋아하는 자의 즐거움 그 자체 아니겠는가?
넘치는 에너지로 격렬한 응원의 원동력을 몸소 보여주는 롯데 자이언츠 응원단장이신 조지훈 단장님과 경기 전에 사진을 찍었다. "사진 한 장 가능할까요?" 그 말에 1도 망설이지 않고, 흔쾌히 응해주셨다. 반할 뻔했다.
선수들이 이용하는 구단 내부 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의료 지원을 나왔다는 이유로 말이다. 저녁 메뉴는 콩국수였다. 이곳은 콩국수 맛집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100점 만점에 1만점을 줬을거다! 이 맛을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싶은데 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식사하다가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준 선수가 있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의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다. 그의 긴 머리를 보고, 언니라고 착각했던 때도 있었다는 건 비밀이다. 경기 끝나고, 흔쾌히 같이 사진을 찍어주던 스윗 그 자체인 김원중 언니를 잊지 못할 거 같다.
"사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나의 말 한마디에 네임팬 부여잡고 바로 사인해주신 분이 있다. 조선의 4번 타자인 이대호 선수다. 경기에서 진 날이라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나가던 팬의 부탁을 쿨하게 들어줬다. 덕분에, 부산 토박이 롯데 자이언츠 골수팬은 행복했다.
야구 보는 걸 즐기지만 그중에서도 직관을 선호하는 편이다. 부산에 위치한 사직 야구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이다. 푸르른 하늘을 구경할 수 있는 야구장에선 관중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응원할 수 있다. 상대 팀 선수에게 "마!"라고 외치거나, "삼진"을 부르짖으며 수비에 성공하길 빌거나, 안타 치길 수없이 바라는 등 모든 이들이 대동단결하여 외치고 바라며 아쉬워하고 다 같이 기뻐하는 그 분위기. 그 속에 빠지다 보면, 현실 속의 고충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
그런 나에게 있어 의무실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본 소감을 말로 표현하는 게 가능할까 싶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 어떤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사직야구장 중앙탁자석, 1루 응원석, 외야석 등등 다양한 곳에서 경기를 관람했지만, 야구광에겐 최고의 자리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프로선수들 사이 치열한 경기의 열기가 확 와 닿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던 거랑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더라. 달리고 슬라이딩을 하는 등 온몸을 던져 경기하는 모습을 통해 나 역시 열정이 활활 타올랐다. 한편으론 걱정도 앞섰다. 그날도 슬라이딩하다 크게 다칠 뻔한 선수가 있었다. 열정적으로 야구에 진심을 표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다. 단지, 다치지 말고 오랫동안 야구장에서 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오래오래 말이다.
야구 덕후 인턴이 야구장 의료지원을 무려 3번이나 가면서 느꼈던 바들은 여기까지다. 언젠가는 또다시 의료지원을 가고 싶다. 프로선수들의 열정을 느끼고자, 격렬하게 경기를 즐기다 다치는 관중들과 선수들을 돕고자, 마지막으로 야구 덕질을 하기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