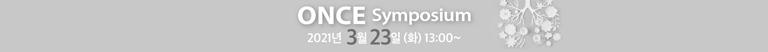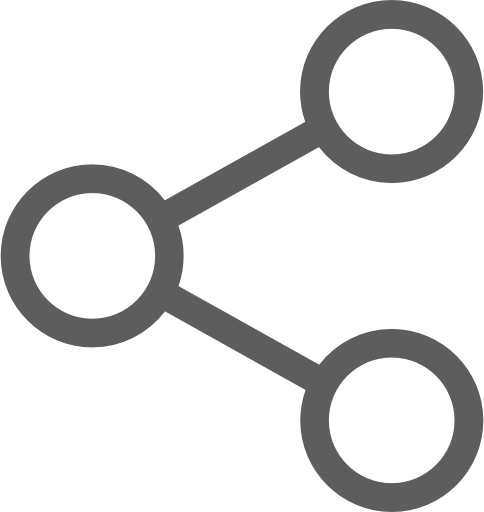에스트로겐, 프로게스틴 약제 등 위험 높여
자궁내 장치·임플란트 등 기기가 영향 적어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틴 등 호르몬을 조절해 임신을 막는 경구용 피임제가 정맥 혈전색전증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자궁내 피임 장치(IUD)나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는 그나마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와 권고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지시각으로 11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피임법이 정맥 혈전색전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2024.28778).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피임법은 기기 삽입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의료기기보다는 경구용 약제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경구용 피임약이 정맥 혈전색전증(VTE)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태.
이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이 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덴마크 올보르그 의과대학 하만 게일란 하산 요니스(Harman Gailan Hassan Yonis)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경구용 피임약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또한 약제와 기기간 차이는 없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15세에서 49세의 총 139만 723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피임법이 정맥 혈전색전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관찰했다.
대상 약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약제, 이에 대한 복합제, 루프, 패치, 자궁내 피임 장치, 임플란트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 139만 7235명의 여성 중 총 2691명이 최종적으로 정맥 혈전색전증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1만인/년 당 표준화된 정맥 혈전색전증 발생률은 아무런 피임을 하지 않았을때 2를 기록했고 에스트로겐 복합제의 경우 10. 프로게스틴 피임약의 경우 3.6, 자궁내 피임장치는 2.1, 임플란트는 3.4를 기록했다.
피임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1만인/년 당 정맥 혈전색전증이 발생률은 에스트로겐 복합제가 4.6, 패치는 5.0, 프로게스틴 피임약은 1.8, 자궁내 피임장치는 1.0, 임플란트는 2.4로 분석됐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다른 요인을 모두 제외했을때 1만인/년 당 피임법으로 인해 추가로 정맥 혈전색전증이 생길 위험을 보면 약제의 위험성이 더욱 크게 드러났다.
자궁내 피임장지는 0.1, 임플란트는 1.4에 불과했지만 복합제는 8.0으로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약제의 제형과 성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레보노르게스트렐이 포함된 에스트로겐 알약은 3.0이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3세대 프로게스틴이 포함된 복합제는 14.2로 월등하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만 교수는 "연구 결과 경구용 피임약은 분명하게 정맥 혈전색전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세대 프로게스틴이 들어간 복합제가 눈에 띄게 위험성이 높았다"며 "하지만 자궁내 피임장치 등은 아무런 피임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도 위험성에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전력과 흡연, 기타 위험요소 등 환자의 상태를 감안해 의료진이 적합한 피임법을 중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