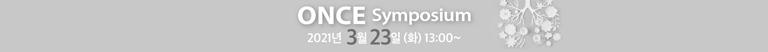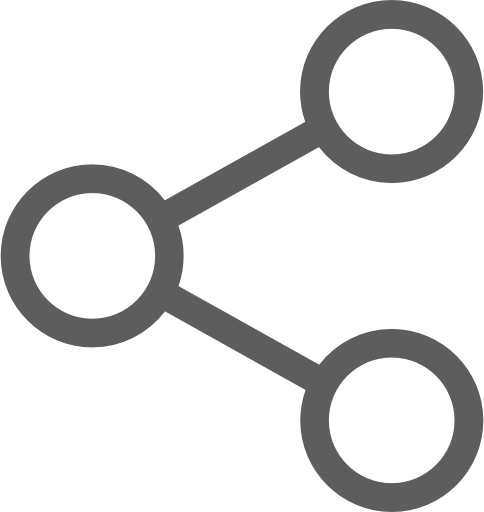의료경제팀 김승직 기자

오랜만에 의사와 환자가 일치단결하는 현안이 생겼다.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통제다. 환자의 의료 선택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의사·환자단체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여론전도 한창이다. 이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는 의료기관·환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것. 의료계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시 의료기관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맞다. 다만 의료계가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의사들은 비급여·실손보험 통제와 반대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던 '문재인 케어'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고가 검사 수요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미래 세대의 의료 이용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였는데, 정부가 보장성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실화했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 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기는커녕, 비급여·실손보험 통제라는 또 다른 무리수로 의료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
이 정책을 추진할 명분도 빈약하다. 비급여로 인한 실손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주장과 달리 주요 보험사들은 높은 영역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파티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비급여·실손보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실손보험 보장이 줄어들면 이득을 보는 것은 보험사뿐이고, 사기업인 이들의 재정을 보전해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과 무슨 상관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들이 일반 병원에서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급여 전문병원, 고급 맞춤형 클리닉 등 고가의 사적 의료 시장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건강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는 것.
나 역시 실손보험 가입자다. 실손보험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이 진짜라면, 정부는 민간보험사 관리부터 시작했어야 한다. 의료기관을 통제해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식은, 이미 앞선 정책에서 실패했던 문제를 답습하는 꼴이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국민과 소통하며 피해 없이 실손보험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에 신빙성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