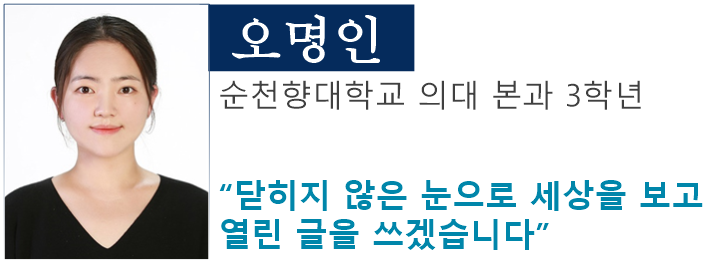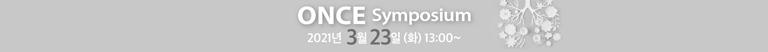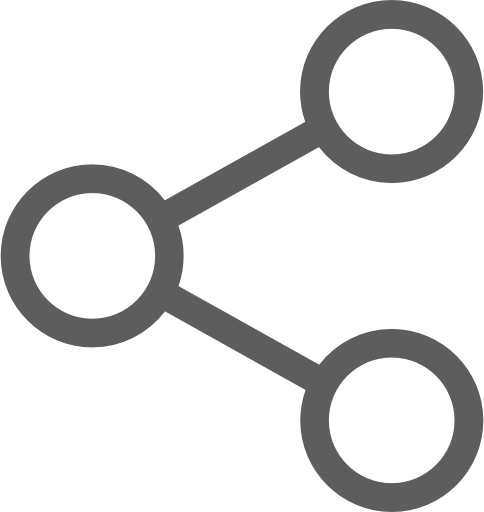순천향대학교 의대 본과 3학년 오명인
투비닥터 사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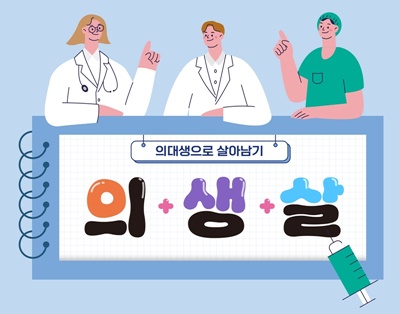
차에서 내리자 차갑고 맑은 공기가 뺨을 스쳤다. 간호사 선생님은 어느새 뒷좌석에서 커다란 가방 두 개를 꺼내 어깨에 메고, 익숙한 듯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다. 엘리베이터 거울에는 검은 숏패딩 아래 흰 실습 가운이 어정쩡하게 삐져나온 내 모습이 비쳤다.
초인종을 누르고 보호자분께 인사를 드린 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곧장 환자분이 계신 방으로 향했다. 그곳엔 가정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공호흡기와 병원용 침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환자분이 내 존재를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다.
지난 12월, 나는 서울대학교병원 재택의료클리닉에서 2주간 실습 인턴으로 참여했다. 언제부터 재택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급히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그날 아침 등교 전 뵀을 때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었는데, 몇 시간 그 병실 옆 좁은 공간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마주했다. 나의 꿈의 직장인 병원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차가운 죽음의 공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체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죽음은 병원에서 일어난다.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많은 이들은 햇살이 드는 창가의 침대에서 가족 곁에서 눈을 감는 평온한 죽음을 상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 열 명 중 일곱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왜 우리는 '집에서 늙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맞이하게 될까? 이 질문이 맴돌았다. 그래서 나는 병원이 아닌 집을 선택한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간호사 선생님은 능숙하게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의사 선생님은 PEG 튜브를 교체하셨다. 보호자는 환자 곁의 정리된 의료용품 더미 속에서 필요한 물품을 익숙하게 꺼내왔다. 병원이 아닌 환자의 침실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진료실로 걸어오지만, 재택의료에서는 우리가 환자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질병이나 신체 상태뿐 아니라, 그들의 거주 환경 전체가 치료의 한 부분이 된다. 예를 들어, 환자 브리핑에서 '걷기 힘든 환자'라고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환자 집 화장실 문턱은 봤니?"라고 질문하셨다.
실제로, 기어서 화장실까지 가는 환자에게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는 문턱 하나도 삶의 질과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였다. 집을 방문할수록 환자의 공간은 더 많은 것을 보여줬다. 침대의 높이,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 병원에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골목이 어떻게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택의료 클리닉은 이 정보를 통합해 전인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다학제 회의에서는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가 각자의 관점에서 환자를 분석하고, 함께 케어 플랜을 수립했다.
비대면 진료 외래도 재택의료의 또 다른 축이다. 우리는 영상통화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을 내린다. 병원 방문이 어렵고 위험한 환자를 위해 보호자가 직접 약을 수령하러 오기도 한다. 진료실을 벗어난 진료, 카메라 너머의 진료. 그 과정은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질문을 남겼다.
왜 정작 병원에 가장 가기 어려운 사람들은, 원격 진료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을까? 실제로 원격의료는 병원에 갈 시간이 부족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모순을 실감할수록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닿게 되었다. 바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어떻게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실습 중 만난 환자들의 병명은 치매, 담도암, 파킨슨병,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희귀질환 등 천차만별이었지만, 병원에 올 수 없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가졌다. 와상 환자 몇 분의 집에 방문한 뒤 교수님께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질문을 받았다.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들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몰라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분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걸까? 그 순간 교수님은 이것이 그분들의 '일상'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곧이어 만난 한 환자는 안구 마우스를 사용해 우리에게 "자주 보니 좋아요"라는 인사를 건넸다. 방금 전까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다. 실습 전에는 말기 환자들이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실습을 마치고 난 지금, 나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물론 임종 준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준비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말기의 초입과 죽음 사이, 그 시간을 어떻게, 어디서 보내느냐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다.
실습을 마친 뒤, 나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 일차의료기관에서의 재택의료가 궁금해졌다. 성남시에 위치한 재택의료 전문기관인 '집으로의원'에 연락해 진료 현장 참관을 요청드렸고, 원장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이번에도 나는 흰 가운 위에 패딩을 걸친 모습으로 진료 현장을 따라다녔다.
상급종합병원의 재택의료가 중증 와상 환자의 케어에 집중되어 있다면,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의 관리와 일상적 처치가 중심이었다. 환자의 상태는 제각각이었지만, '병원에 오는 것이 어려운 환자에게 직접 찾아간다'는 점은 같았다.
집에서 병을 앓는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병원에서는 손을 뻗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는 스스로 하거나 보호자의 손에 의지해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도 늘 존재한다. 그리고 집에서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선택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자신의 터전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지. 그 선택이 가능해야 우리는 집에서도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환자를 찾아가는 병원'이 생기는 그때,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