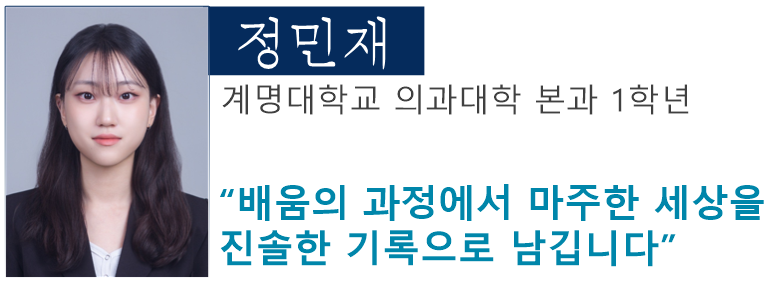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정민재

연초에 적는 글 앞머리에 쓰기엔 멋쩍을 만큼 식상한 말이지만, 정말이지 순식간에 한해가 지나갔다. 학교로 돌아간 후로는 유난히 더디었던 하루들이 쌓이더니 속절없이 한 해가 저물었다.
1월에는 1학기 교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던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실습을 했다. 그래도 2주마다 시험이 몰아치던 12월보다는 몸이 편해진 터라, 새해면 으레 그렇듯 새로운 운동을 해보자는 다짐으로 태권도를 등록했다.
태권도 성인반에는 의외로 나와 비슷한 또래의 20대 초반 여자들이 많았는데, 타지에서 대학 생활 중인 나에겐 이런 '동네 친구'가 귀해서 수업 전후로 종종 이야기를 나누며 어울리곤 한다. 의대생끼리만 어울리며 살다 보니, 이렇게 전혀 다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새삼스럽다.
"의대면.. 개구리 해부 뭐 이런 거 해요?" "아뇨, 저흰 사람 해부해요…"
으악, 하고 그들은 진저리를 친다. 얼마 전 만난 중학교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진짜 사람 시체를 본다고? 으, 난 못해 못해" 그런 반응을 보고 있자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다. 과연 당신들이라고 못할까? 우리가 뭐 대단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걸까?
그럴 리 없다. 처음 하는 정맥 채혈 실습에 손을 바들바들 떨며 애를 태우는 동기들만 봐도 그렇다. 우리 중에 남의 팔에 바늘을 찔러넣는 데 대단한 재능이 있어 의대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전국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능숙하게 해내시는 기본적인 술기조차 아직은 두려운 내가 유능한 의사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할까. 서로를 첫 실습 대상으로 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생리학 교수님은 실습 시간에 기회가 주어질 때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당부하셨다. 나중에 PK 때도 어떤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나서야 한다고, 해보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아예 오지 않는다고.
'꿀을 빤다'는 말이 있다. 사실 실습 시간에 '꿀 빠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조별로 이루어지는 실습에서 굳이 앞서 나서지 않고 조원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그만이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슬쩍 빠져도 실습은 무탈히 끝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꿀'일까.
새내기 시절,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대학 생활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있던 나는 스페인어를 배워보고 싶어 '초급 스페인어'를 시간표에 담았다. 하지만 선배들과의 자리에서, 제2외국어 수업은 전공자나 해당 언어 능력자들이 학점을 따기 위해 많이 들어 힘들 거라며, 이른바 '꿀강의'들을 추천받았다. 결국 나는 스페인어 대신 학점을 받기 쉬운 널널한 수업들을 선택했다.
선배들은 예과 1학년을 편하게 즐기라는 마음에서 해준 진심 어린 조언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그 선택을 오래 후회했다. 관심 없는 분야의 수업은 도무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수업을 빼먹거나 수업에 가더라도 의미 없이 시간만 죽이다 오곤 했다. 지각과 결석을 꽉 채우고도 학점을 잘 받았으니 나름 '꿀을 빤' 셈이지만, 돌아보니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차라리 그때 스페인어 수업을 들었다면, 고생은 좀 했어도 무언가 남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잠깐의 편안함은 결코 인생의 꿀이 되지 못한다. 기회가 올 때마다 인생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부디 올해의 나는 조금은 두렵고,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기꺼이 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