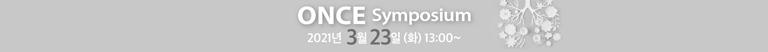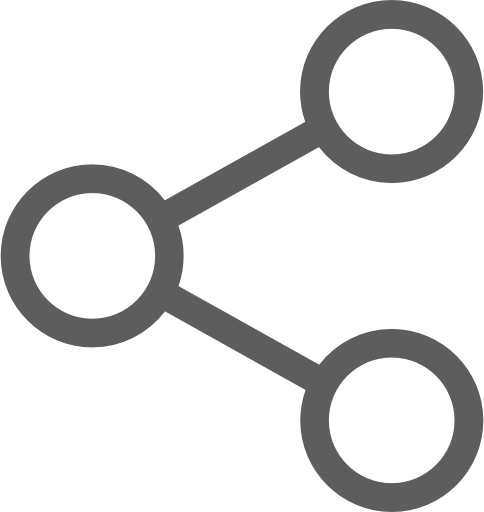문성호 의약학술팀 기자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미국암연구학회(AACR)와 함께 세계 3대 암 학회로 꼽히는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5)가 마무리됐다.
올해도 임상현장 진료지침을 뒤바꿔놓을 임상연구가 쏟아져 나온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사들도 그동안 갈고 닦았던 임상 결과를 가지고 독일 베를린 현장을 찾았다.
이로 인해 행사 시작 전부터 'K-바이오'가 ESMO 2025에 출격한다고 큰 주목을 받았다.
5일 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일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ADC(antibody-drug conjugate) 계열 약물들의 약진과 함께 중국 임상발 임상연구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엔허투와 다트로웨이, 파드셉 등 ADC 계열 약물들의 적응증 확대는 예견됐던 결과물이지만 중국 연구진의 임상연구들의 성장은 글로벌 항암신약 시장에서 더 큰 존재감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중국에서 한 임상이기에 글로벌 3상 임상을 다시금 해야 한다는 평가는 이전과 마찬가지였지만, 연구 결과 면에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행사의 3일차 핵심 발표 세션인 '프레지덴셜 심포지엄(Presidential Symposium)' 4개의 임상 연구 발표 중 3개가 중국 임상연구진의 발표일 정도다.
이를 두고 국내 의료진들도 글로벌 임상연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발표된 결과 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호평을 내리기도 했다.
ESMO 현장에서 만난 서울성모병원 김인호 교수는 "연구 결과 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물"이라면서 "요로상피암 관련 연구 중에서도 HER2 타깃 ADC인 디시타맙 베도틴(Disitamab Vedotin) 관련 연구도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HER2 타깃 ADC인 디시타맙 베도틴(Disitamab Vedotin)의 경우 중국 제약기업 RemeGen이 자체 개발한 것이지만 현재는 화이자가 글로벌 임상을 주도하고 있다.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 신약개발 그룹에 합류한 것이다.
반면, ESMO 2025에서 확인한 국내 임상연구의 입지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참여 기업들도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인상이 짙다. 포스터 형태로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주요 임상연구 주역으로 성장한 중국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설자리는 더 좁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년 현장에 참여하는 국내‧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들은 포스터 발표도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을 정도다. 매년 포스터 발표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이 주된 이유다.
물론 신약 개발은 수년의 연구 끝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상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가 필수적이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 위험 관리, 그리고 강력한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강점인 임상현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논의 '인사이트'에 합류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